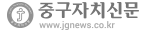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지난 5월 22일 항소심 제12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판결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피해에 대한 개인보상 차원을 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흡연과 폐암・후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십 년간의 역학연구와 세계보건기구(WHO)・국제암연구소(IARC)의 권고로 이미 입증됐다. WHO는 담배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흡연으로 매년 80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개인과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묻는 법적·사회적 과정으로 담배소송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흡연은 중독성이 강한 질병 유발 요인이라는 점이다. 담배회사는 흡연이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짐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왔다.
이는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이윤을 얻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는 1998년, 46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마스터합의‘를 이끌어 내 담배회사가 25년간 2,060억 달러를 지급하고 광고도 제한하게 했다.
또한, 2015년 캐나다 케벡주에서는 약 15조원 규모의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브라질 같은 신흥국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흐름이다.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는 없다.
셋째,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다,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 비흡연자까지 부담을 나눠지는 구조는 사회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공단은 담배회사가 최소한 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 소멸시효와 인과관계의 문제다, 담배 피해는 장기간 축적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언제부터 책임을 묻느냐”를 따지는 방식은 현실의 피해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흡연 관련 질병은 담배회사가 만든 구조적 위험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보고 있다.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민 모두가 담배로 인한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부당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보험자로서 사명감과 의지가 담겨있다.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준다면, 담배회사의 책임범위는 단순한 소비자 개별 피해보상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비용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의 금연정책의 정당성 강화 등 공중보건정책 전반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재판부가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국민 건강을 지키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